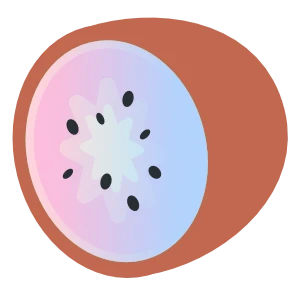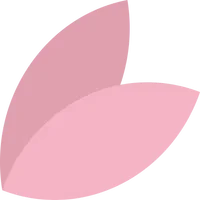기획의 변: 퀴어 연구의 위치 : 도착─한국성소수자/퀴어연구학회 계간 웹진
한국성소수자/퀴어연구학회 · 창간호(2025.6.) l 퀴어 연구의 위치기획의 변: 퀴어 연구의 위치양준호도착 [명사]목적한 곳에 다다름.옷 따위를 거꾸로 입음.뒤바뀌어 거꾸로 됨. 또는, 본능이나 감정, 덕성의 이상으로 사회나 도덕에 어그러진 행동을 나타냄.(출처: 표준국어대사전)‘도착’은 말장난 하기 좋은 단어다. “목적지에 다다르다”는 뜻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뒤바뀌어 어긋나다”라는 뜻도 가진다. 정해진 목적지에 이른 상태만이 아니라, 목적지가 어긋나고 방향이 뒤바뀌고 길을 잃은 상태도 아우른다. 성소수자/퀴어 연구 웹진이 출발하기에 아주 좋은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도착’에는 그런 유희성만이 아니라 규범에서 벗어난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불온한 것으로 낙인찍어 온 역사가 들러붙어 있다. ‘도착적’이라는 낙인은 오랜 시간 퀴어 연구를 그 어떤 전통도, 전문성도, 진지함도 없는 지식으로 주변화하고 배제하는 논리로 작동해 왔다.『도착』은 단어 ‘도착’이 가진 이런 폭넓은 유희와 광범한 역사성을 오히려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부적격한 앎으로 배제되어 왔던 성소수자/퀴어 연구를 발굴하고 확산함으로써 ‘적절한’ 지식이 무엇인지를 승인하는 학계 안팎의 질서에 도전하고자 한다. 동시에, 한국어 ‘도착’이 지닌 한국성을 십분 활용해 한국의 성소수자/퀴어 연구라는 지정학적 조건을 질문함으로써 지식 생산의 식민주의적 위계를 성찰하고자 한다.한국성소수자/퀴어연구학회의 계간 웹진 『도착』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이번 창간호의 기획 주제는 “퀴어 연구의 위치”다. 다음 두 가지 질문이 창간호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된다. “한국에서 성소수자/퀴어 연구의 위치는 어디인가?” 그리고, “성소수자/퀴어 연구에서 한국은 어떤 위치인가?” 첫 번째 질문은 한국 안에서 퀴어 연구가 지금껏 어떤 위치를 점해 왔는지, 지금의 지식 장에는 어떤 앎을 되돌려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특히, 12.3 계엄 이후 지속되는 정치적 격변과 개혁 요구의 현장에서 퀴어 연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성찰하면서 광장에서 퀴어 연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자 경험인지 탐구한다.두 번째 질문은 한국이라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성소수자/퀴어 지식을 생산하는 일이 갖는 탈식민주의적 함의에 관한 물음이다. 한국이라는 공간에서 퀴어 연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조건 위에서 가능하거나 불가능해지는가? 한국이라는 공간을 대상으로 퀴어 연구를 할 때 마주하게 되는 식민/제국주의적 위계와 어려움은 무엇인가? 한국 퀴어 연구가 어떻게 지식의 식민주의적 위계를 비판하고 개입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품고, 한국에서 퀴어 연구를 한다는 것에 관한 연구자들의 생각과 경험을 듣는다.전원근은 한국에서 성소수자/퀴어 연구의 제도화라는 국면에서 퀴어 연구를 시작하고 지속할 수 있는 조건이란 무엇인지 질문한다. 퀴어가 사회의 안보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안정적인 삶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질 때, 안전한 퀴어 연구는 어떻게 상상할 수 있으며 이때의 안전은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 ‘안전’을 열쇠말로 한국에서 퀴어 연구를 한다는 것의 의미를 성찰하며 이번 호의 문을 연다.김민조는 대학원에서 퀴어연극이라는 연구 대상을 만나기까지의 개인적인 여정을 통해, 기성 학계 안에서 퀴어 연구라는 간학제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경험을 들려준다. 퀴어연극 연구를 대하는 기존 연극학계의 반응이 “죄송하지만 제가 퀴어는 잘 몰라서…”라는 말로 귀결되기 십상이라는 저자의 고백은 현재 한국 학계에서 퀴어 연구가 취급되는 방식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퀴어 연구가 예외적인 지식이자 언제나 낯선 학문으로 비춰질 때, 한국에서 퀴어 연구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어떠한 지식 생산이 퀴어 연구를 ‘퀴어 연구’로서 생존할 수 있게 하는 걸까? 저자는 이러한 질문으로 우리를 이끈다.전혜은은 아프고 가난한 몸을 이끌고 한국에서 퀴어 이론 연구와 번역을 병행하는 삶의 불안정성에 관해 이야기한다. 퀴어 연구를 전문적인 학문으로 인정하지 않는 학계의 무지는 계급적 특권과 신체의 소진을 담보로 굴러가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와 맞물려 가난하고 아픈 퀴어 연구자를 더욱 취약한 자리로 내몬다. 저자는 이론 연구와 번역 작업을 “침대에서 운동하기”의 계보에 놓는 한편, 이론을 연구하고 번역을 지속할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은 무엇인지 자신의 삶의 단편을 통해 이야기한다.조수미는 퀴어문화축제를 연구하는 인류학자의 위치에서 12.3 내란 이후 탄핵 광장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의 경험을 생생하게 기록한다. 앨라이(ally)로서 자신이 ‘퀴어 연구자’가 되기까지의 연구자 일대기를 펼쳐 보여주며 저자는 제도권 학계에서 연구 노동자로 일하는 퀴어 연구자의 취약성과 소외를 고백한다. 대학 공간에서 성소수자/퀴어 연구자로서의 이력이 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실 속에서 퀴어 연구자가 실제 어떤 고민들 사이에 끼어 있게 되는지 그 경험을 공유한다.손숙영은 용주골 투쟁에 연대한 경험을 통해 광장에서 생겨나는 정치적 의미를 감각하는 또다른 방법에 관해 쓴다. 저자는 승리 아니면 패배의 경험으로만 광장을 기억하는 관습에 반론을 제기하며 ‘실패할 것이 뻔한’ 용주골에서의 투쟁이 정치적 의미를 획득하는 순간을 포착한다. 승리에 대한 기대나 정치적 성과 및 효능감을 줄 수 없는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런 변화는 어떻게 정치적인 감각으로 이어지는가? 저자는 이미 광장이었던 용주골에서의 경험을 통해 무엇이 퀴어 정치로 불릴 수 있는지, 광장에서 발생하는 정치의 퀴어한 의미는 무엇인지 고민한다.마지막으로 이번 창간호에는 라운드테이블 비판적 퀴어 연구의 구축과 과제를 수록했다. 김대현, 루인, 오혜진, 임동현, 정성조가 참여한 이 대화는 2024년 7월 19일 성소수자 대학원생/신진연구자 네트워크의 첫 번째 학술대회 "성소수자/퀴어 연구의 과거, 현재, 미래"에서 진행되었다. 이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한국에서 성소수자/퀴어 연구로 박사학위를 쓰는 과정에서 지녔던 문제의식을 나누고, 한국에서 성소수자/퀴어 연구의 최근 경향과 쟁점을 짚으며, 학술장을 어떻게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지 논의하였다.
queerstudies.kr








 Shinku8620
Shinku862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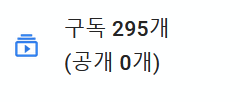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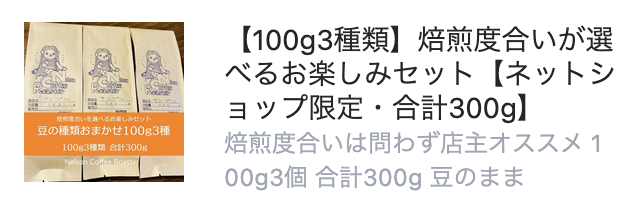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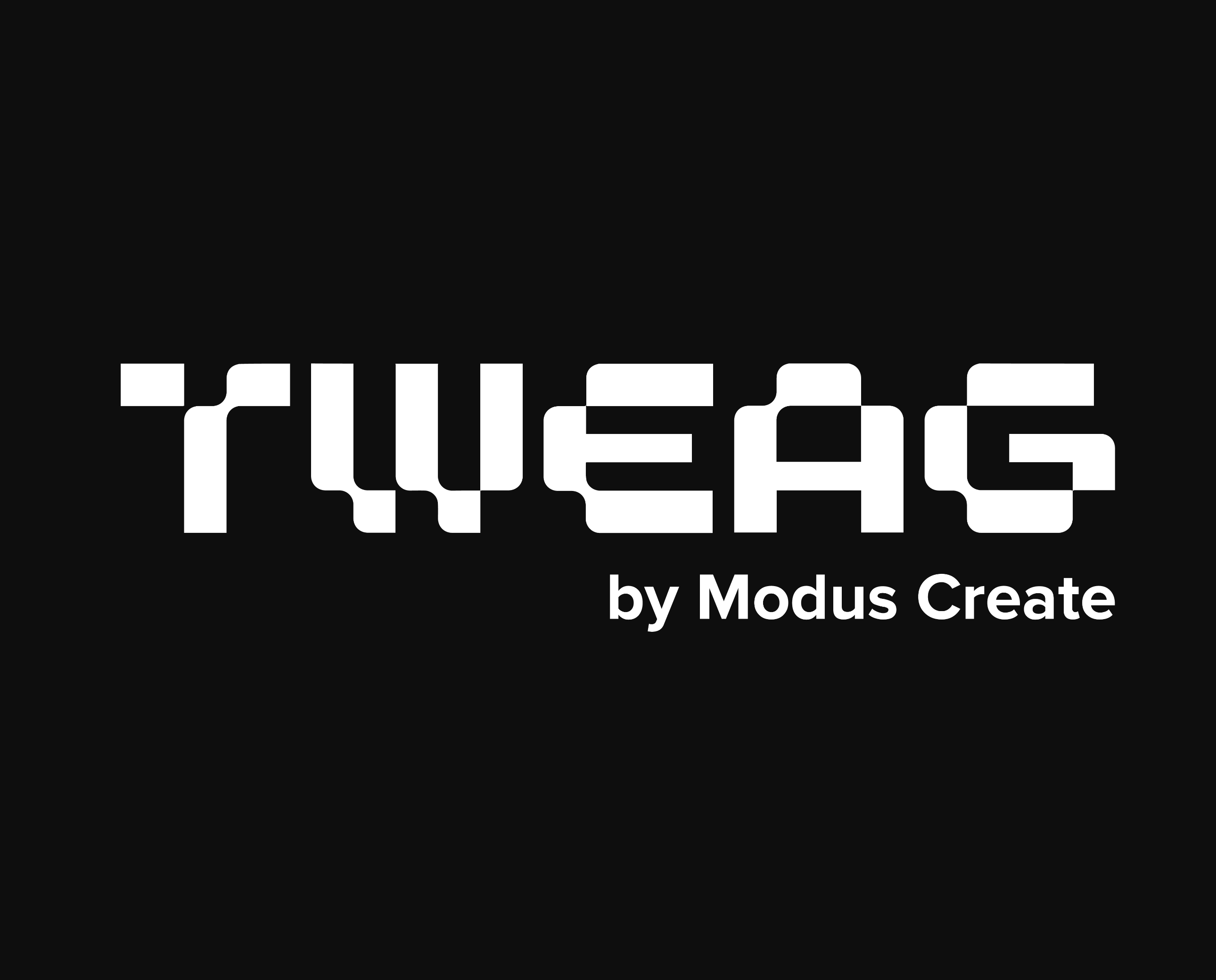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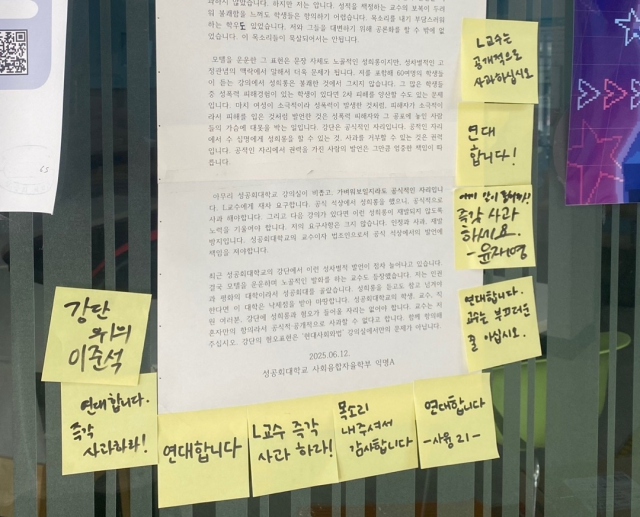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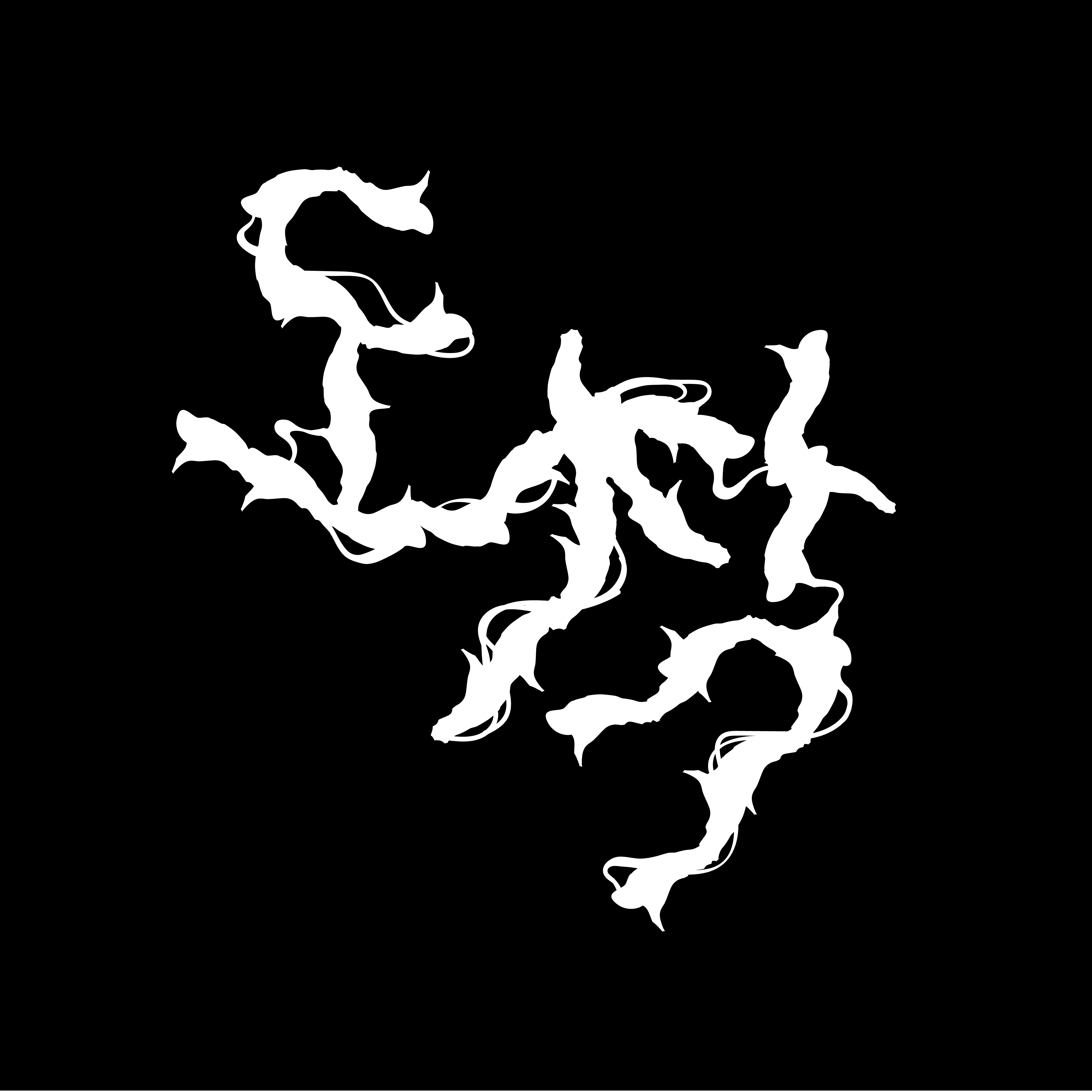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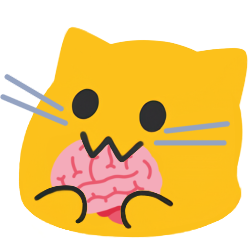 불가사리 소년
불가사리 소년 

 依田芳人
依田芳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