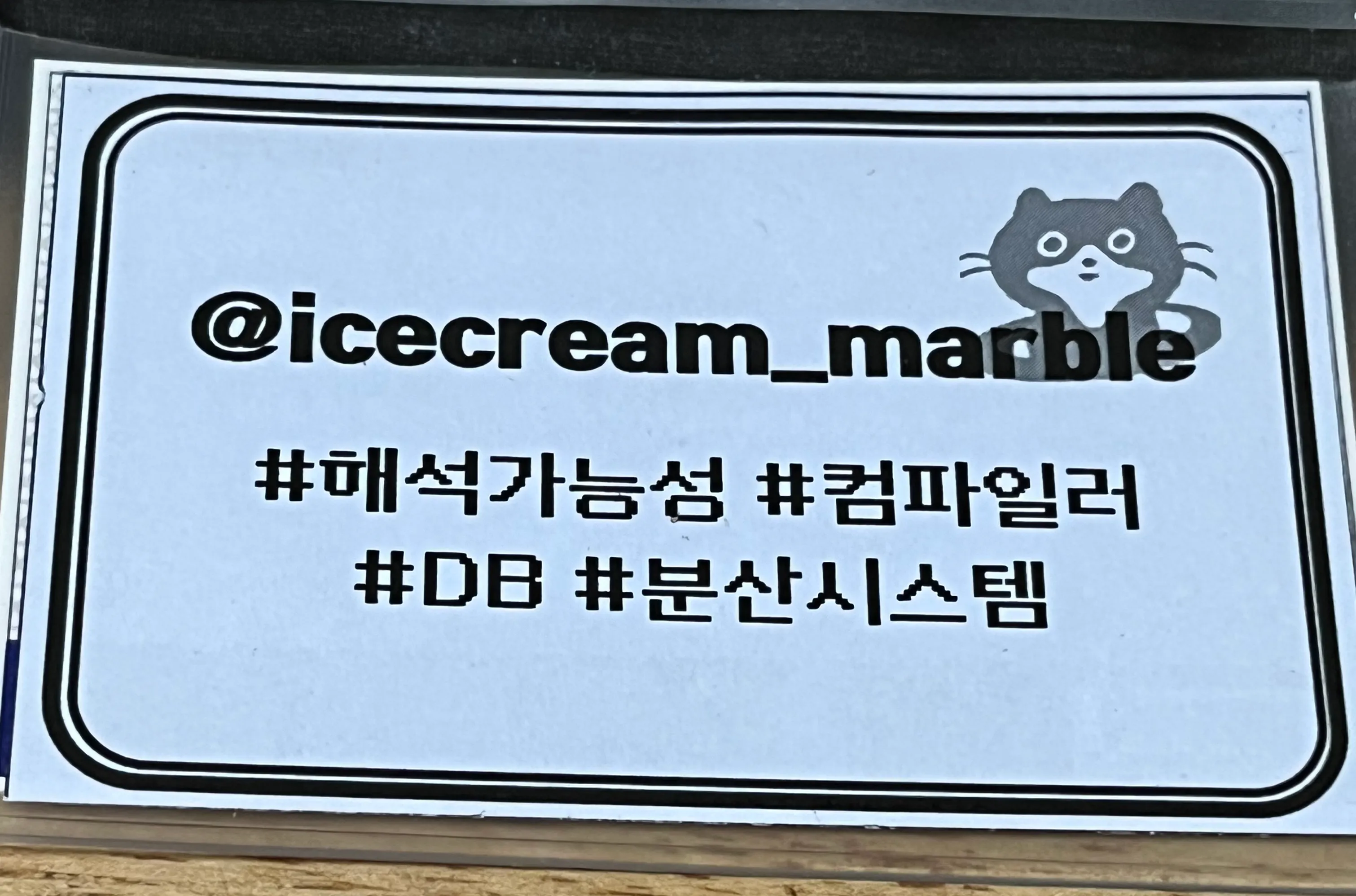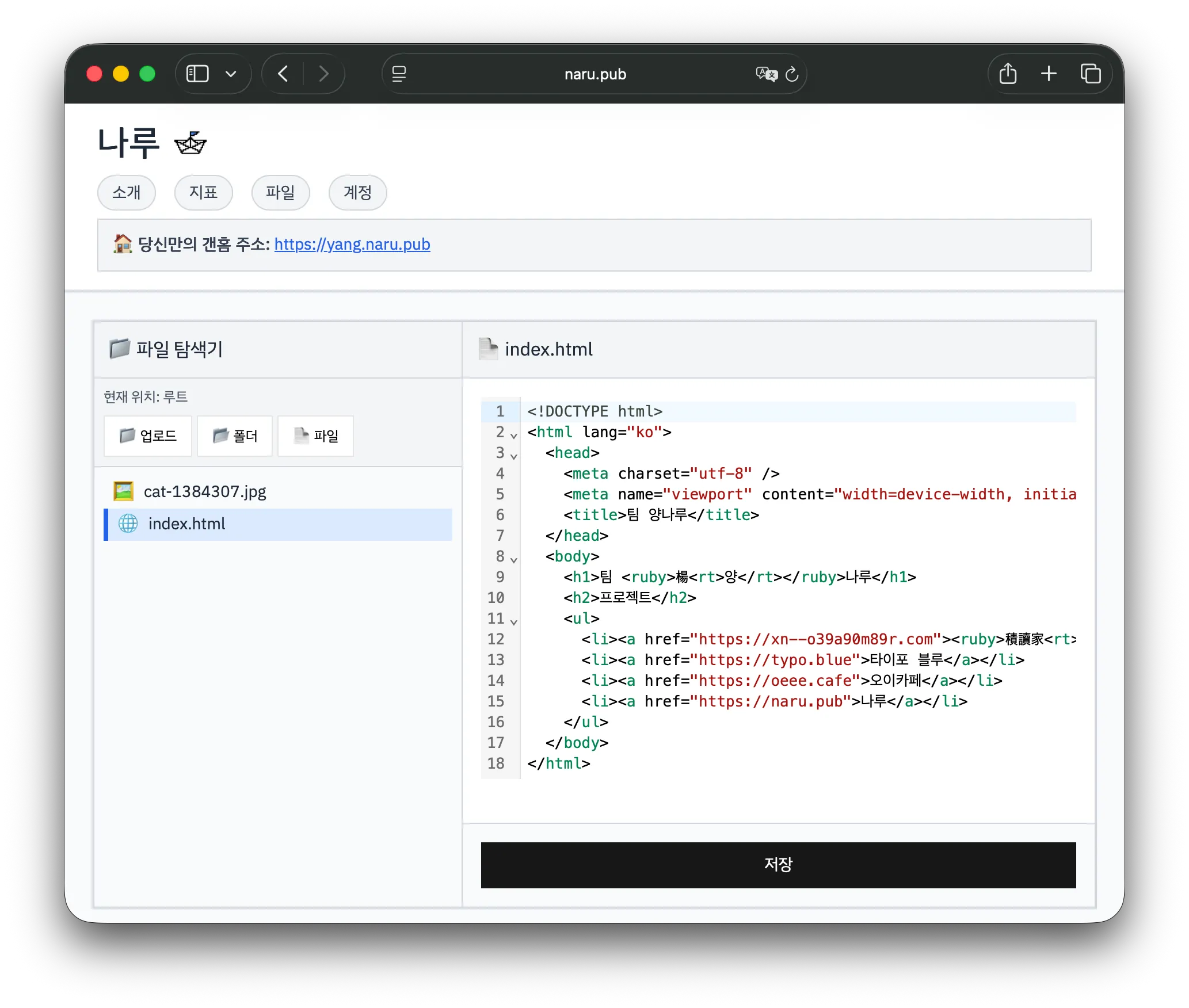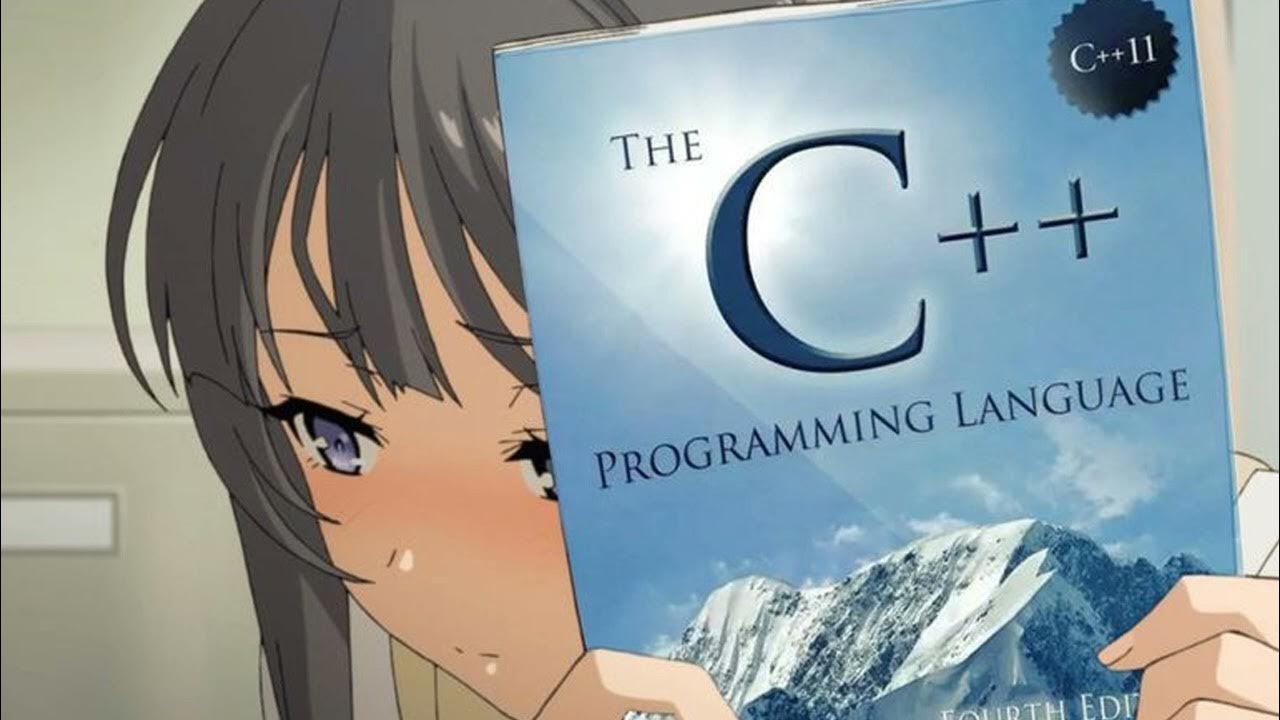살짝 다른 차원에서 확장해서 바라보는 얘기이긴 한데 그냥 첨언하자면 언어학의 하위 분야인 화용론에서 전제(Presuppositions)라는 주제랑 연결되는 것 같네요. 댓글에 프랑스 왕은 머머리다 예문도 써주신 걸 보니 더욱 더 그런 것 같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일단 한국어 예문으로 하면 살짝 오해의 소지가 있어 영어 예문을 갖고 쓰면 다음과 같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 P: The King of France is bald.
- Q: There exists an entity that is King of France.
이 때 P의 명제가 참일 수 있는 이유는 Q를 전제로 깔고 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Q를 전제로 갖고 가면 P에 부정을 넣어도 (The King of France is not bald 혹은 ¬(The King of France is bald)) 여전히 그 명제는 참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Q는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프랑스는 군주국가가 아니니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는 여전히 참을 진리값으로 가지죠.
따라서 실제로 전제를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Levinson, 1983, p. 175).
- A sentence P sematically presupposes a sentence Q iff:
- (a) P ⊨ Q
- (b) ~P ⊨ Q
참고로 여기서 "⊨"는 "함의한다"를 지칭하는 기호입니다 (예: "하스켈은 함수형 언어다."란 문장은 "하스켈은 언어다"란 걸 함의하죠.).
그렇다면 Q가 전제되는 건 알겠는데, 이 진리값이 무엇이느냐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언어학자들은 보통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참으로 간주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참도 거짓도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전자같은 경우엔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바라보는 거고, 후자의 경우엔 참/거짓이라는 기존 이치논리(two-valued logic) 혹은 1 또는 0으로 하는 불 논리에서 확장해서 Kleene의 삼치논리(three-valued logic)로 가게 되죠.
참고로 전제 성립 여부 포함 화용론 전체에서 깔고 가는 가장 큰 가정이 하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바로 해당 발화(utterance) P, 즉 '프랑스왕은 머머리다'라는 명제가 이루어질 때 화자와 청자가 프랑스에는 왕이란 개체가 존재한다(=Q)라고 암묵적으로 서로 동의한다라는 가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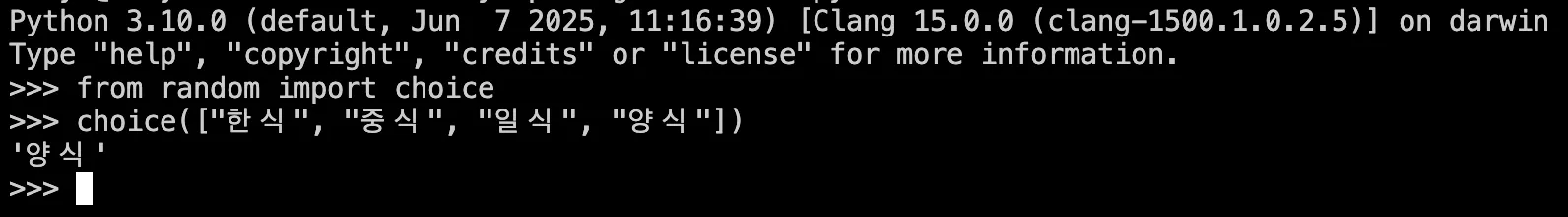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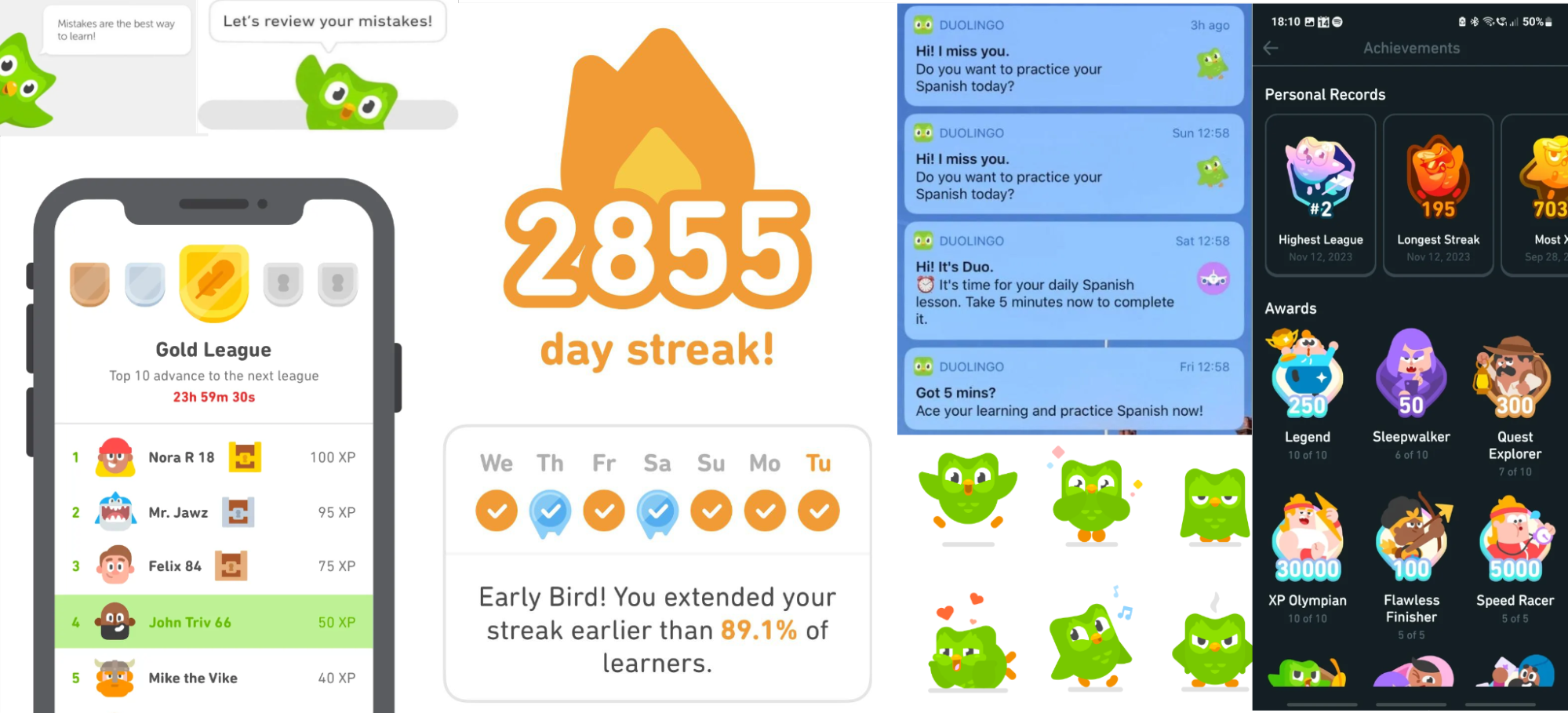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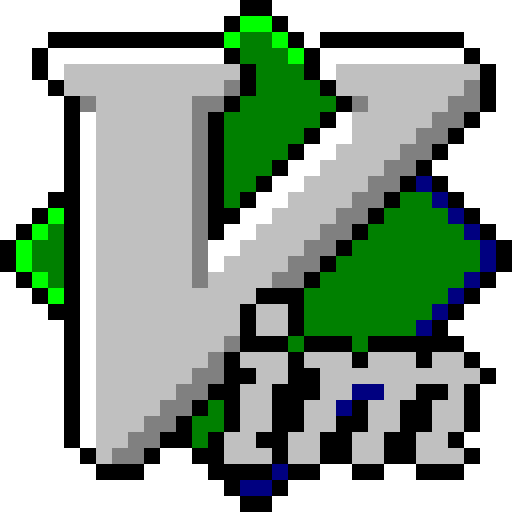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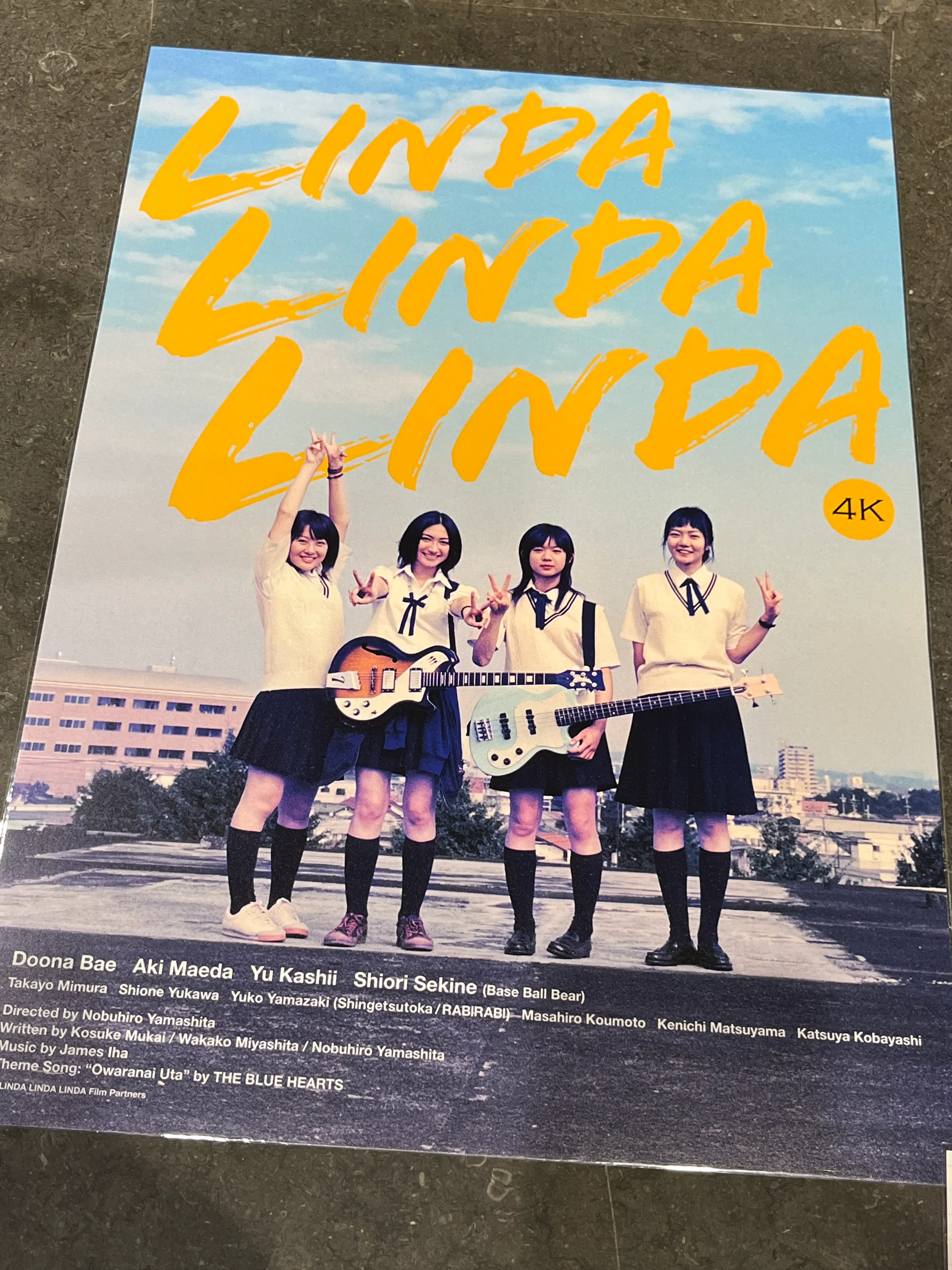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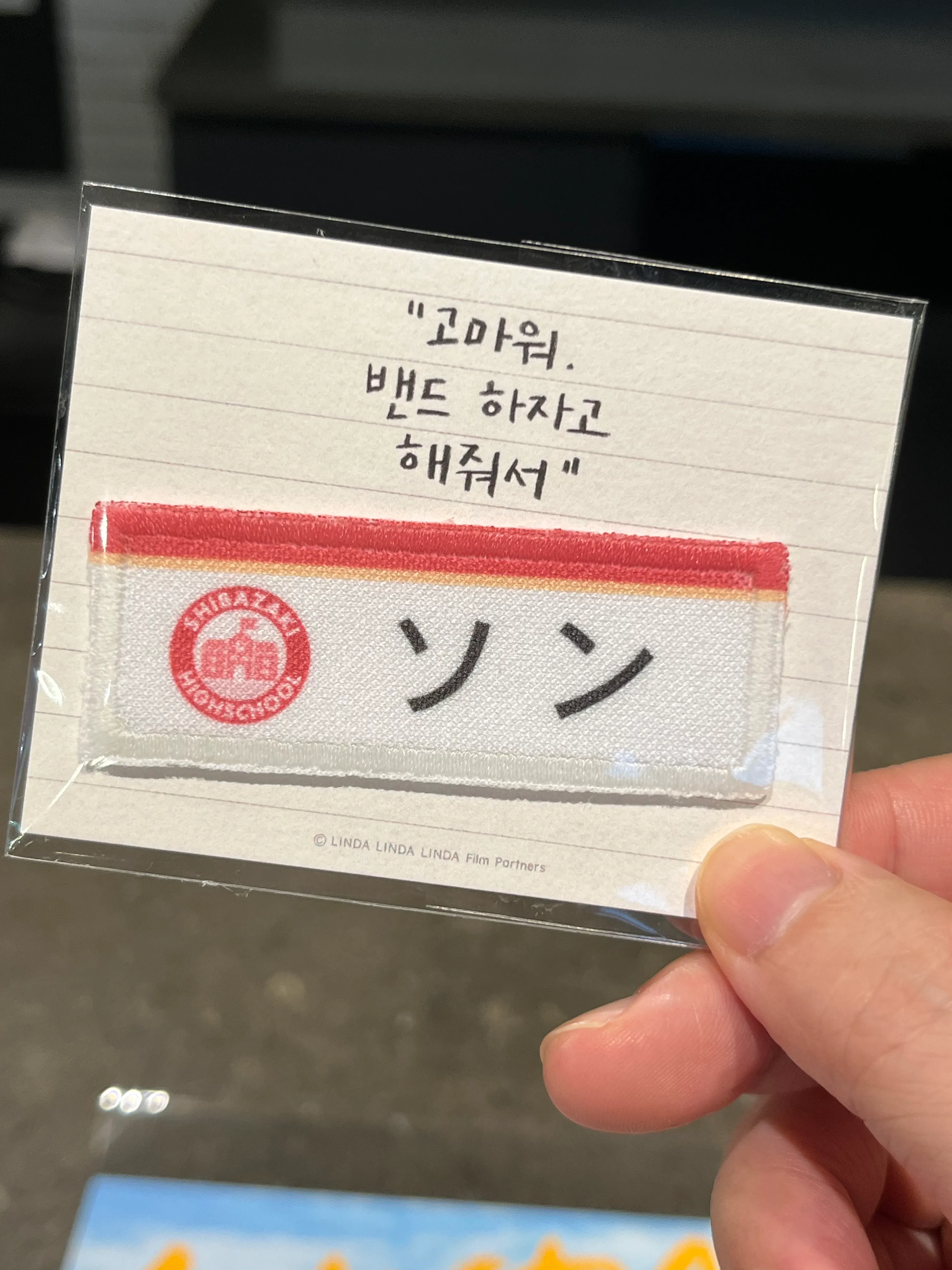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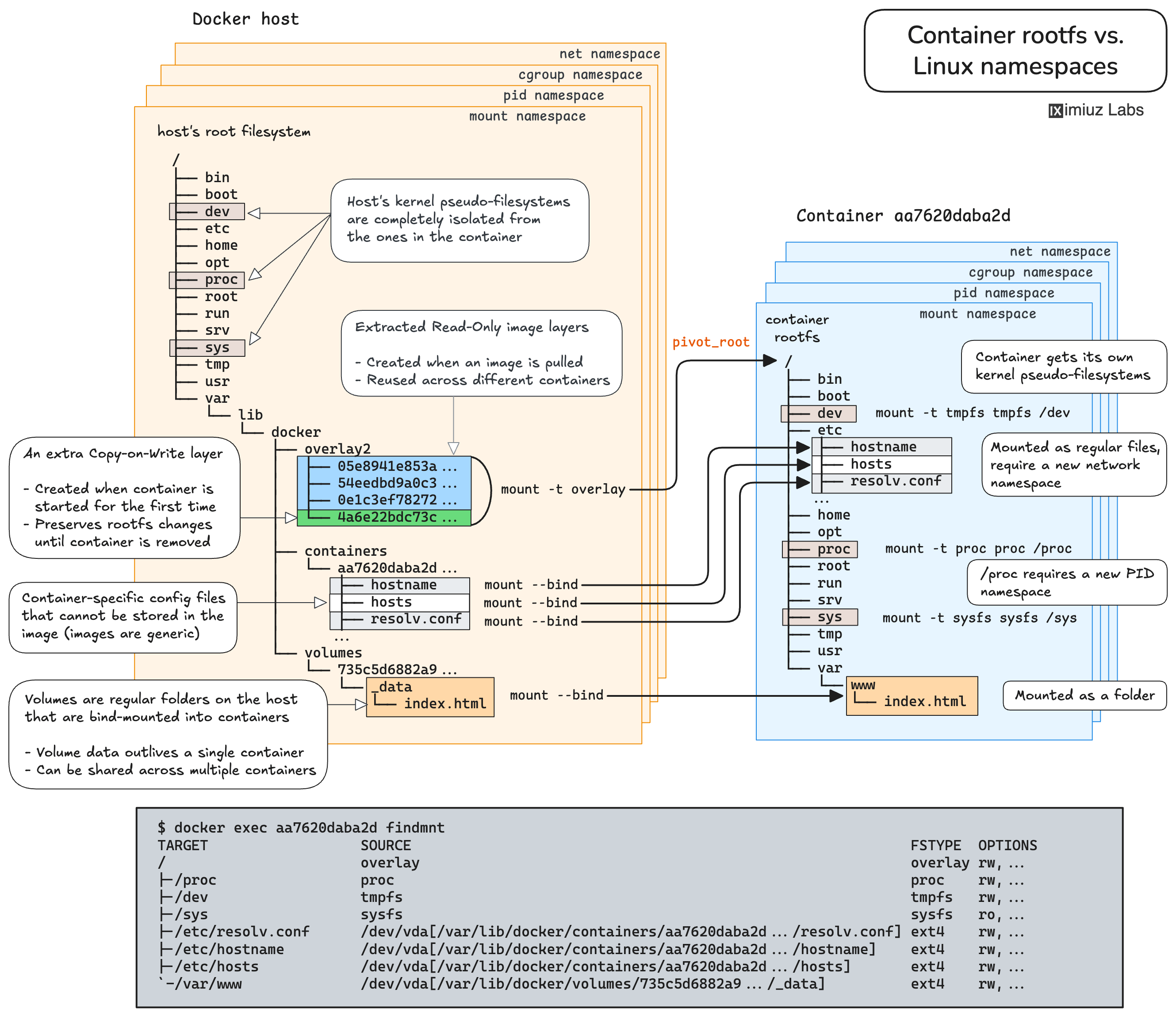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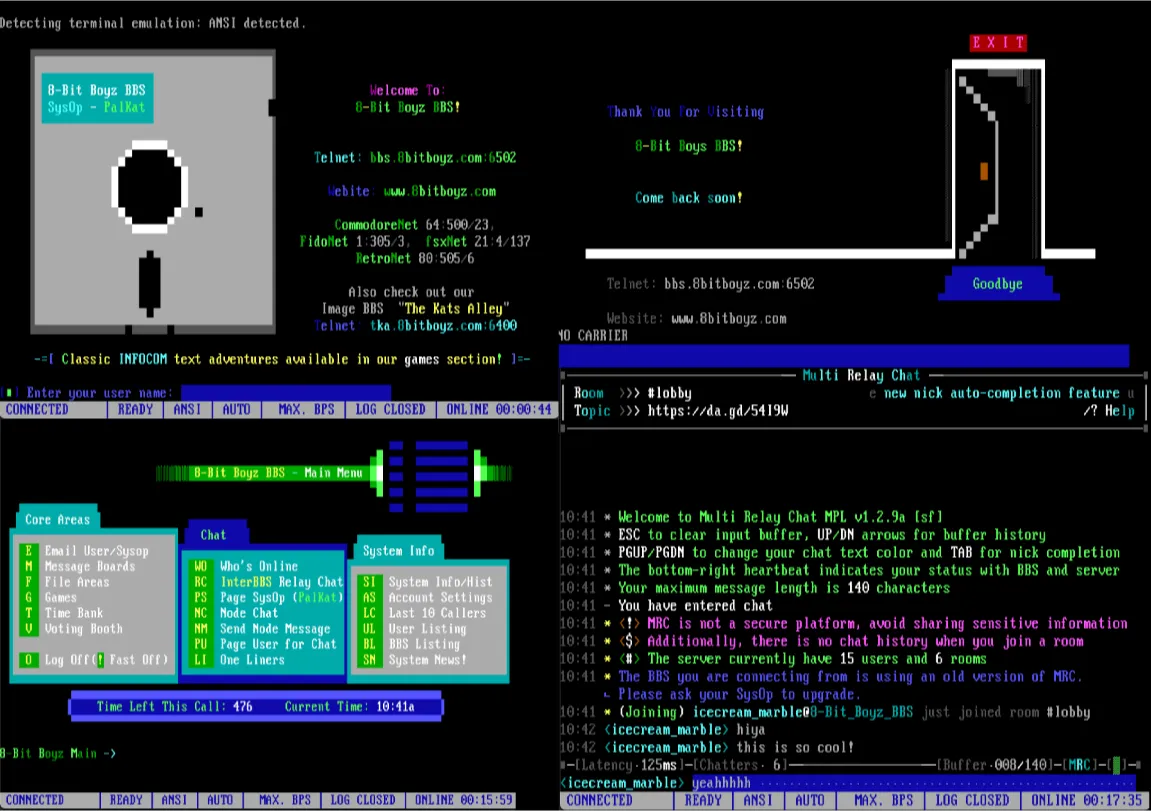
 一般 Kyungmi Ahn ꉂꉂ(ᴖᗜᴖ*)
一般 Kyungmi Ahn ꉂꉂ(ᴖᗜᴖ*)